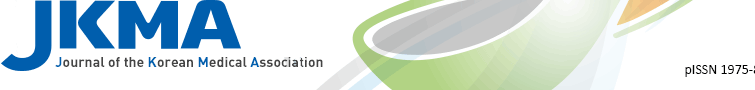|
 |
- Search
| J Korean Med Assoc > Volume 67(5); 2024 > Article |
|
Abstract
Background: In February 2024,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leased a policy proposal for healthcare reform, with one of the main pillars being increased medical school admissions. This policy has sparked intense opposition from the physicians’ top association. Most importantly, interns and residents—the bedrock of the medical workforce in Korean hospitals—began to leave en masse. Consequently, a medical crisis emerged, in which many medical and surgical procedures were delayed.
Current Concepts: According to studies on comparative health policy and systems, the cris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in which the administration and doctors have failed to establish a substantive dialogue through which policy options are examined and deliberated. These dynamics necessita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space for interest group politics, causing both to suffer from a lack of action repertoires. The stalemate we witness reflects the enduring patterns of the same issue.
Discussion and Conclusion: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current initiative, institutional arrangements must be established in which policymakers and physicians make a credible commitment to each other. Alternatives, for instance, include reactivating and regularizing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ould pave the way for establishing a venue where key stakeholders can discuss future agendas, such as how to ensure improved accessibility to “essential” care and mitigate its subnational variation, thereby creating a long-term vision for new health system governance in South Korea.
Current Concepts: According to studies on comparative health policy and systems, the cris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in which the administration and doctors have failed to establish a substantive dialogue through which policy options are examined and deliberated. These dynamics necessita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space for interest group politics, causing both to suffer from a lack of action repertoires. The stalemate we witness reflects the enduring patterns of the same issue.
Discussion and Conclusion: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current initiative, institutional arrangements must be established in which policymakers and physicians make a credible commitment to each other. Alternatives, for instance, include reactivating and regularizing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ould pave the way for establishing a venue where key stakeholders can discuss future agendas, such as how to ensure improved accessibility to “essential” care and mitigate its subnational variation, thereby creating a long-term vision for new health system governance in South Korea.
정치학의 고전 중 하나로 꼽히는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의 저작 Political Organizations (1995; 1973) 16장의 제목은 ‘조직과 공공정책(Organizations and Public Policy)’이다. 여기서 이른바 ‘공공정책의 정치’에 관한 유명한 정식화가 제시된다. 그는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이득(benefits)과 비용(costs)의 분포 양상에 따라 상이한 정치 유형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이득과 비용이 각기 집중되거나 분산되면서 네 가지 다른 형태의 갈등이 산출될 수 있다. 일례로, 개혁에 따른 이득과 비용이 모두 인구 전체에 분산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득이 인구 전체에 분산되는 반면 비용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면, 해당 집단은 그러한 비용을 흔쾌히 부담하려 들지 않을 공산이 크다. 윌슨이 예로 든 것은 1965년 실시된 미국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이었다[1]. 오늘날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슈 역시 이와 동일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 늘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 방침에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핵심인력으로서 이번 갈등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한 전공의협의회 역시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런데 이런 대립은 그리 낯설지 않다. 2020년 여름, 코로나바이러스병-19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정부는 이른바 4대 개혁 시도, 즉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고, 의료계는 집단 진료거부를 통해 이를 저지했다. 이처럼 특수 이해관계(special interests)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통상 ‘이익집단 정치’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이익집단 정치가 강 대강 일변도인 것은 아니다. 비교(comparison)가 논의의 분석력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라는 데 동의한다면, 간략한 국가 간 검토가 유익하다.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에 기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원형은 유럽대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세기 후반 독일은 가입자의 보험료(contribution)를 건강보험기금이 공동으로 운영해(pooling)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최초로 고안해냈다[2]. 그러나 동시에 유럽식 사회보험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가장 동떨어진 체계이기도 하다. 이 체계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부문에 관해 연방정부가 규정한 프레임워크가 작동하지만, 독일에서 건강보험 운영의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기금과 의사 간 협상에 근거한다. 반면 한국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기금과 같은 자율성을 갖지 않으며, 의사 대표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결정사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한국이 위치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 1970년대 한국이 의료보험제도를 설계할 때 직접적 준거가 되었던 일본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실제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 모델을 먼저 경험한 탓에 적지 않은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일본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런 관심에 대부분 빠져있는 것은 그런 모델의 수립을 실제로 가능케 하는 정치적·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다. 무엇보다 우리와 달리 보건복지 부문에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정치적· 재정적 역량을 갖고 있다. 단적으로, 일본 코로나19 대응의 실질적 주체가 현(縣) 정부였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이익집단이 쇠퇴하는 경향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본의사협회가 구축해 온 정치적 힘인 네트워크와 협상력 모두 여전히 의협과는 같은 선상에서 말하기 어렵다[3].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진화는 발전국가 모델의 공유에서부터 권위주의 정권을 벗어난 민주화 이행의 경험까지 정치 경제 체계가 극도로 유사한 대만과도 다르다. 한국과 대만은 비슷한 시기에 전국민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했지만 이후 정책발전의 궤적은 상이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어떤 형태의 보건의료 개혁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유일한 예외라 할 수 있는 작은 ‘성과’는 2013년, 7개 질병군 부문에 대한 진단명 기준 환자군 또는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s) 강제실시가 될 것이다. 반면, 대만은 2002년 총액예산제(global budgeting) 개혁을 이루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는 의협이 가장 적대시하는 지불제도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대만치과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이후 협회 회장이 정부 요직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것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을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면 미국의 경험과 만나게 된다.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 첫째, ‘작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한국을 미국, 일본과 비교한 선행연구들이 시사하듯이[4], 한국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 부문에 맡겼다. (따라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사들의 통상적인 불만은 강력한 수가 규제에만 주목한 채 인력생산, 전달체계, 지불제도, 의료의 질과 같은 나머지 영역을 간과한 착시다.) 둘째, 미국의 의학교육 제도가 정착하면서 보건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문의(specialist)가 대거 배출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이른바 ‘개원의 체제’가 수립되었다[5]. 말하자면, 대다수 한국의 의사들은 전문의 훈련을 받았지만 본인 소유의 의원을 개업하면서 실제로는 일반의(general physician)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전달체계의 수준에 따라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미국식 체계와 차별된다. 게다가 의료인력 생산방식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후 한국은 혁신주의 시기(progressive era)의 미국과 달랐다. 19세기 내내 강고하게 뿌리를 내린 지역별 후견정치(patronage politics)에 맞서 과학적 권위의 확보를 통해 조직적으로 결집한 미국의 의사와 달리, 한국의 의사는 집합적 정체성을 확립할 계기를 갖지 않았다[6]. 대신 개별 자영업자로서의 의식이 이들의 뇌리에 깊게 뿌리내렸다.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이후 국가-의사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상당한 재정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는 한, 의사들이 정부와 집합적 수준의 관계를 형성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사실상 정부 규제 없는 자율적 진료가, 의료보험의 실질화 이후에는 소위 박리다매식 진료와 비급여가 그 보상의 주요 수단이었다.) 이는 이들의 직역과 소속—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교수—에 무관하게 관철된다.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이 이들의 본격적 이익집단화를 추동한 분명한 계기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도 양자관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정부가 어떤 개혁을 시도할 때에만 그에 반대하면서(reactive) 강력하게 결집했을 뿐, 능동적으로(proactive)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정부 관계를 재편할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러한 제도배열의 정착과 이후 진화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치가 왜소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0년에 일단락된 일련의 보건의료 개혁인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상대가치수가제 도입 등을 뒷받침한 핵심 동력은 1980-1990년대에 시민사회 세력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보건의료 정치는 수면 아래로 잠복했고(submerged),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의 질 향상, 지역 간 건강형평성 보장과 같은 또 다른 중차대한 과제들은 체계적인 정책의제로 다뤄지지 못한 채, 간헐적인 일부 수가 조정과 같은 미시적인 정책 조정의 대상에 머물렀다. 요컨대 국가-의사 관계의 미정립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치의 공백’을 야기했으며, 이는 곧 문제해결의 레퍼토리(repertoire)가 빈곤해짐을 뜻했다. 거의 언제나 이 분야의 갈등이 극단적 대립의 양상을 띠는 것은 그 결과다.
윌슨의 텍스트로 돌아가보자.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조직대표와 이해관계 협상의 정치는 해당 조직의 당사자가 개진하는 견해가 청취될 것, 그들의 선호가 고려될 것, 그리고 정책의 결과가 논의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7].” 이 글이 씌어진 배경은 사회운동이 거대한 정치변화를 이끈 1960-1970년대였다. 하지만 그는 시대적 조류에 반해 여전히 정치변화에서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의 정식화에 따르면, 이득이 분산되고 비용이 집중될 때 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정책 혁신가(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정책입안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역할은 해당 개혁이 간직한 공익적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집중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공급자라면 규제기관을 포획(capture)하려는 시도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이익집단 정치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 정치가 작동할 조건들이 부재한 한국에서, 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해당 정책의 수용을 강요하고 공급자는 ‘파업’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되풀이되는 것은 놀랍지 않다. 달리 말하면, 정책 혁신가가 활용해야 할 레퍼토리에는 ‘운동’만이 기입되어 있고 ‘숙의’와 ‘협상’과 같은 여타 선택지는 애초에 비어있는 셈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에릭 패터슈닉(Eric Patashnik)이 역설하듯이, 정책개혁은 의문의 여지없는 ‘정치적 프로젝트(political project)’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법안 통과나 정책이 시행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정책의 성공 여부는 ‘그 이후’(post-enactment phase)의 성과에 달려있다[8]. 패터슈닉의 통찰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공명하는 까닭은, 정부의 목표인 필수의료의 안정화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전달체계 개편과 지불제도 개혁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환기해두자.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권역 병·의원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성과기반 일차의료 확립 등이 거론된다. 후자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명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지불모델(alternative payment models)을 제시하는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한다[9]. 이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겨냥하는 미래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의 의사 집단 전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고, 그런 만큼 하던 대로 접근한다면 더욱 강력한 저항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지금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의 의료비 증가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로는 (사회보험의 근간인) 사회연대 원칙을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공급자 공히 ‘신뢰가능한 관여(credible commitment)’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의 발표가 당초 계획대로 현실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더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s)’의 구축이 선결과제로 대두해 있다. 무엇보다 이는 양자 모두가 지난 20여 년간 미뤄왔던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정책입안자들은 그간 반복해 온 희생양 찾기와 비난 회피(blameavoidance) 의 회로에서 벗어나야 한다[10].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사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새로이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인구학적 및 기술적 변동을 고려하면서도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를 숙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책무가 있다. 건정심의 정상화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내실화가 그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여기서 단시간의 급박한 수가 협상을 되풀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수립이나 전공의 복무 비용에 대한 공적재원 투자와 같은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공급자의 실질적인 정책 관여를 보장하되 그에 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공급자에게도 쌓아둔 숙제가 산재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는 선택지에 대한 반대를 되풀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개혁 의제를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자체의 정치적·정책적 역량을 배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 노력은 의학교육에서 정책학습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자리매김하는 데서부터 의사의 정치의식 형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익 집단 정치는 그저 직역의 가시적 이해타산을 보호하는 논리와 등치되지 않으며, 조직의 사회적 기여 증대가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때 공고히 작동한다. 일례로, 미국 의사들의 최대 조직인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2019년 4월에 건강형평성센터(Center for Health Equity)를 조직 내에 공식적으로 설치한 데 이어, 2022년 6월에는 투표권(voting right)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11,12]. 1960년대 민권운동 시기에 유색인의 정치적 권리 신장에 가장 강력히 반대한 세력 중 하나가 AMA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변화의 폭과 너비를 짐작할 수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압도적 찬성이라는 현재의 여론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informed decision)이 아니라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절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의사 집단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현실은 대중 참여(public engagement)에 관한 이들의 전략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는 대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의 압박이 ‘성공’한다면 언론은 이를 보건의료 ‘개혁’의 중요한 성취로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인력 증원만으로는 더 나은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 수 없으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다른 정책 패키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양자 간 신뢰 구축의 토대라는 미래의 자산을 갉아먹으면서 이익집단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동력이 또다시 소진된다면, 새로운 거버넌스의 수립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막대한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가 간취해야 할 교훈은 이것이다.
Acknowledgement
I would like to thank Yong-Jun Choi, a professor of social medicine at th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for helping me prepare for the submission.
References
1. Wilson JQ. Organizations and public policy. In: Political organiz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 332-337.
2. In: Immergut EM, Anderson KM, Devitt C, Popic T, editor. Health politics in Europe: a handboo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3. Takakazu Yamagishi. Health insurance politics in Japan: policy development, government, and the Japan Medical Associ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22.
4. In: Yang JJ, editor.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Edward Elgar; 2020.
5. Cho BH. The change of Korean doctors’ professionalism and their dominance over health care system. Health Soc Sci 2019;51:15-39.
6. Grogan CM. Grow and hide: the history of America’s health c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7. Wilson JQ. Organizations and public policy. In: Political organiz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 345.
8. Patashnik EM. Reforms at risk: what happens after major policy changes are enact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policy proposal for essential care. Accessed April 18, 20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133&act=view
11.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Support for safe and equitable access to voting H-440.805. Accessed April 18, 2024. https://policysearch.ama-assn.org/policyfinder/detail/voting?uri=%2FAMADoc%2FHOD.xml-h-440.805.xml
12. Ganguly A, Morelli D, Bhavan KP. Voting as a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leveraging health systems to increase access to voting. NEJM Catal Innov Care Deliv 2023;Jan. 26. [Epub]. https://catalyst.nejm.org/doi/full/10.1056/CAT. 22.0368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발표와 이어진 의료계의 저항 과정을 기술하고, 그간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독일, 대만 등과 비교하고 한국의 특성을 설명한 논문이다.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논의와 소통 부재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패턴을 지적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도 배열, 의료계의 능동적인 개혁의 제시, 정치적 역량 배양, 대중 참여 전략 부재 등을 극복할 것을 제안하여 향후 의료계가 고민해 볼 문제점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치학적 개념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
METRICS

-
- 1 Crossref
- Scopus
- 1,747 View
- 93 Download
-
Related articles in
J Korean Med Assoc -
Strategies to enhance public health doctor system in South Korea2024 June;67(6)
Current status of health promotion in Korea2022 December;65(12)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Health Care Reform in Korea2000 August;43(8)
Future directions of emergency healthcare policy in Korea2010 October;53(10)